 ▲ 중국, 비트코인(BTC) |
중국이 2021년 전국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지만, 그 점유율은 조용히 전 세계 20% 수준으로 다시 치솟았다.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허브로 복귀했다. 이는 전면적인 암호화폐 금지를 시도했다가 단속의 비효율성을 깨닫고 결국 규제로 선회하거나 금지령을 철회한 여러 국가의 전례와 궤를 같이한다.
11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1년 중반 비트코인(Bitcoin, BTC) 채굴을 불법화했을 때 산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해시레이트(Hashrate)는 거의 0으로 급락했고, 채굴 농장들은 해체되어 운영자들이 카자흐스탄, 러시아, 미국 등으로 대거 이주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화폐 채굴 거점 중 하나로 복귀했다.
로이터 통신과 크립토퀀트(CryptoQuant)의 네트워크 추정치에 따르면, 값싸고 풍부한 전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 비트코인 채굴이 은밀하게 부활했다. 이로써 중국은 전 세계 3대 암호화폐 채굴 허브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수치로 중국 채굴자들이 전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14%에서 20%를 기여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업계 소식통과 신규 시설 건설 현황을 보면, 과거 잉여 수력 발전으로 유명했던 신장(Xinjiang)과 쓰촨(Sichuan) 지역으로 채굴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신장에서 채굴을 재개한 왕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잉여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기 어려워 암호화폐 채굴 형태로 소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등장은 분석가들에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중국 당국이 분산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음에도, 채굴 금지 후 1년 이내에 네트워크 데이터는 채굴 활동이 중국 영토로 다시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해시레이트 점유율에서 미국에 이어, 측정 기간에 따라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안정적인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시도가 실패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흔하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가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려 했으나, 단속이 어렵고 금지 조치 유지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규제 체제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2022년 전면 금지를 시도했으나 곧 규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철회했으며, 지금은 채굴 합법화와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 사용까지 허용한다.
짐바브웨, 볼리비아, 인도, 나이지리아 등도 모두 한때 암호화폐 거래 및 은행 서비스를 금지했다가 법원 판결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을 거쳐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규제 체제로 전환했다.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 실패는 여러 구조적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값싼 전력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장 같은 지역은 송전망 문제로 전력을 분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채굴 하드웨어는 작고 운반이 쉬워 은닉하기 용이하며, 소규모 채굴자들은 산업 시설이나 농촌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수익성이 높아 채굴 유인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비트코인이 성숙함에 따라 해시파워는 지리적으로 더욱 분산되며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여주고 있다. 베이징의 지속적인 회의론 속에서도 채굴자들은 전력망의 틈새에서 생존 공간을 찾아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비트 옵션 데일리] 미결제약정 569억 달러, 전일比 8% 증가…10만 달러 콜 거래량 최다](https://c-kill.com/wp-content/uploads/2025/11/u1w3uymv74-kkYsPW-768x356.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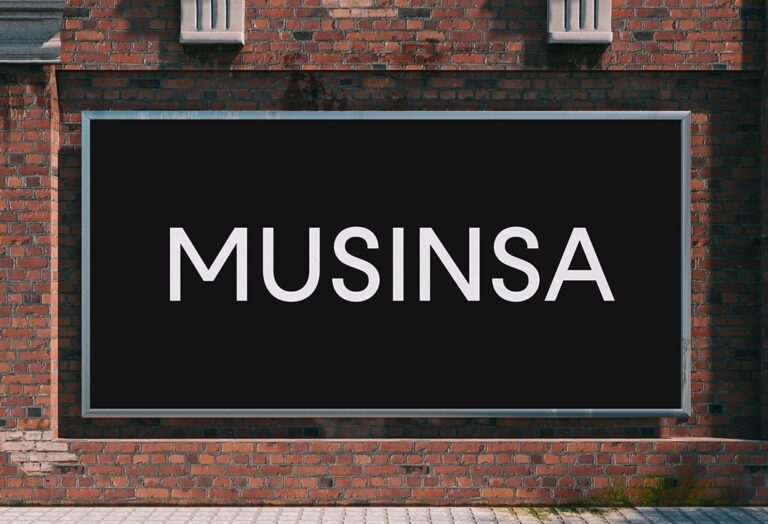

![[이더 옵션 데일리] 미결제약정 115억 달러, 거래량 풋 우위](https://c-kill.com/wp-content/uploads/2025/11/jvasa8ye51-Rh448k-768x353.png)
![[코인 갱신 일지] ESPORTS·GOOGLX 등 신고점…N3ON 최저점 경신](https://c-kill.com/wp-content/uploads/2025/11/2r5bify2q9-AA0edx-768x466.jpg)

![[비트코인은 지금] 8만7700달러 반등…거래량 20% 급증·공포지수 15](https://c-kill.com/wp-content/uploads/2025/11/myye2mjtse-UmIVTd-768x576.png)

![[월가 유동성 레이더] 코인베이스 대규모 순유출 후 정상화…프리미엄 –0.038%·기관 거래량 하루 52% 급등](https://c-kill.com/wp-content/uploads/2025/11/gc2rcv5ndg-2URKFQ-768x576.png)
답글 남기기